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 『명심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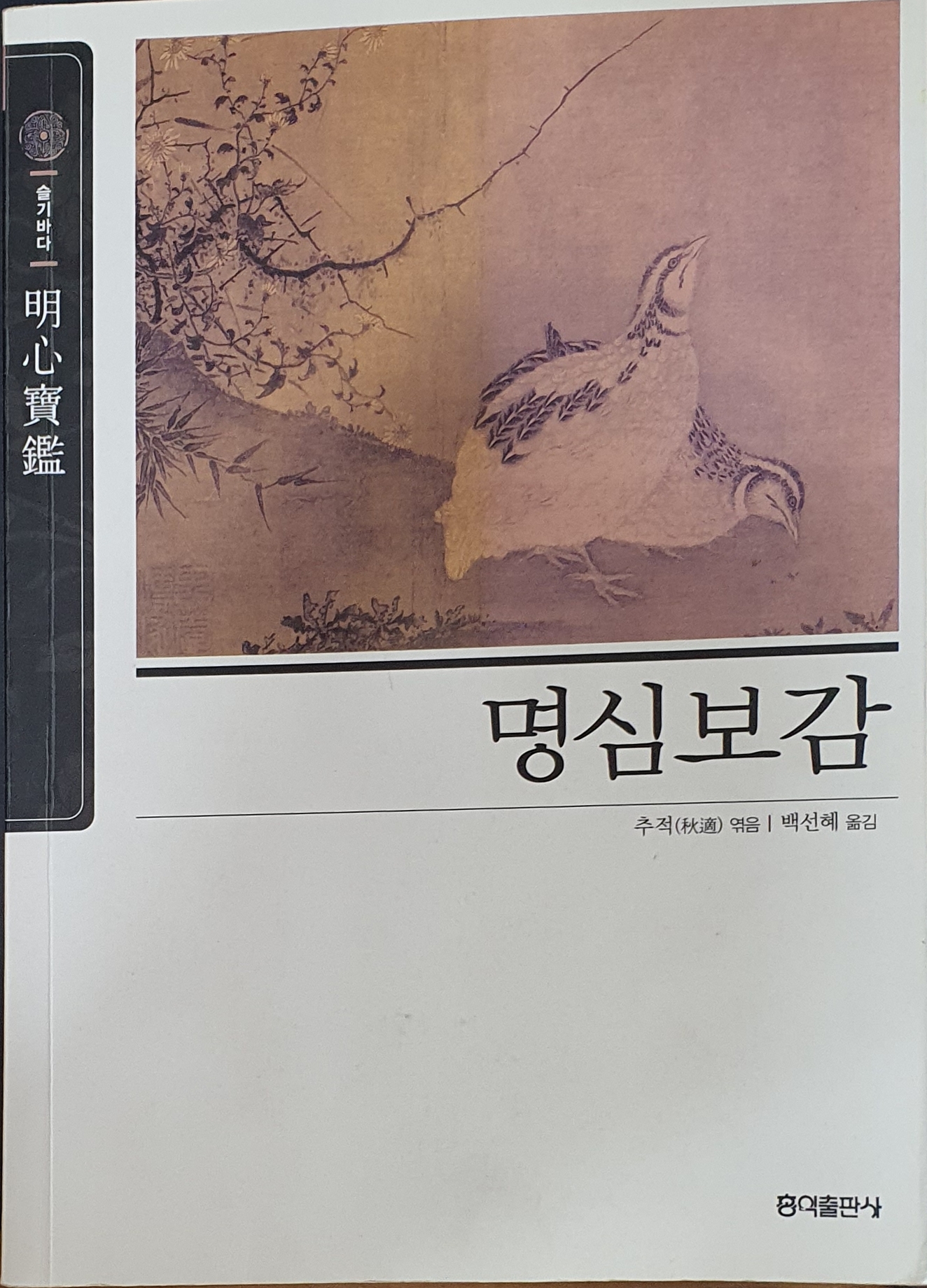
1. 책이름
누구나 한번쯤은 『명심보감』이라는 책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명심보감은 '밝히다'라는 뜻의 명(明)과 '마음'이라는 뜻의 심(心)과 '보배', '보물'이라는 뜻의 보(寶)와 ’거울'이라는 뜻의 감(鑑)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명심보감이란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이 된다.
2. 책 속의 사람, 책 속의 책
책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명심보감』은 삶의 교훈서이다.
한 사람이 일관된 주제로 정연한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 말과 전적 속에서 교훈이 될 만한 것을 골라서 편집하는 체이다. 여기에 인용되는 인물과 저작은 매우 광범위하다. 공자맹자 등의 유가사상가, 장자 · 열자 등의 도가사상가, 태공 · 사마광 등의 정치가, 당 태종 · 송 휘종 등의 제왕들, 도연명 · 소동파 등의 문인들, 주돈이· 정호· 정이 · 주희 등의 유명한 송대 성리학자들, 동악성제·재동제군 등의 다른 교훈서에서는 볼 수 없는 도교의 신선들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많은 사람들의 금언과 격언과 좌우명들이 실려있다. 그리고 인용되는 저작물도 상당히 다양하다. 중국의 오래 된 서적인 『시경』 (최초의 시집), 『서경』(최초의 정부문서), 『주역』 (점술서), 선진시대 유가사상의 선구자인 공자의 어록집 『논어』, 각 종 예의에 관한 학설들을 모아놓은 『예기』, 역사서로 가장 저명한 『사기』와 『한서』, 도가 계열의 저작 『소서』, 아동학습서인 『동몽훈』 과 『안씨가훈』, 송대 『근사록』과 『성리서』라고 통칭하여 말한 성리 학의 저작들, 송대 소용이 엮은 시집인 『이천격양집』 민간의 기담 모아 놓은 『설원』, 『이견지』등의 기담집에서부터 지금은 전하지 않는 『경행록』, 『익지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들이 발췌본으로 쓰이고 있다.
3 판본과 구성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명심보감』 은 고려시대 추적(秋)이라는 사람이 엮은 초략본 19편에 5편의 글이 증보된 증보편이다. (초략본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본이 앞서 있었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엮은이가 추적 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 초략본이 오랫동안 읽히다가 증보편이 유포되었다.
추적의 초략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착하게 살라'는 뜻의 계선(繼善)이 10장으로, '하늘을 두려워 하라'는 '천명(天命) 7장, '천명을 따르라'는 순명(順命) 5장, '효도를 하라'는 '효행(孝行) 6장, '몸을 바르게 하라'는 정기(正 己) 26장, '분수를 받아들이라'는 안분」(安分) 7장, '마음을 보존하라'는 '존심(存心) 20장, '성품을 경계하라'는 「성」(戒性) 9
장(10장으로 나눌 수도 있다), '부지런히 배우라'는 「근학」(勤學) 8장, '자식을 가르치라'는 「훈자」(訓子) 10장, '마음을 살피라'는 「성심」(省心) 90장(상편 55장, 하편 35장), '가르침을 세우라'는「입교」(立敎) 15장, '정치를 잘하라'는 치정」(治政) 8장, '집안을 잘 다스리라'는 치가(治家) 8장, '의리있게 살라'는 안의」(安義) 3장, '예절을 따르라'는 준례」(遵禮) 7장, '말을 조심하라'는 '언어」 (言語) 7장, '친구를 잘 사귀라'는 교우(交友) 8장, '훌륭한 여성이 되라'는 「부행」(婦行) 8장으로 모두 19편(성심을 상·하편으 로 나눌 경우에는 20편) 262장(계성을 10장으로 나눌 경우에는 26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보편은 '덧붙임'이라는 뜻의 증보』 (增補) 2장, '반성을 위한 여덟 곡의 노래'인 '팔반가팔수(八反歌八首) 8장, '효도를 하라 속편'이라는 뜻의 '효행(孝行續) 3장, '청렴하게 살라'는 「염의」(廉 義) 3장, '배움을 권장한다'는 뜻의 권학」(勸學)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5편 20장이다.
4. 엮은이와 전승과정
『명심보감』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졌지만 정작 엮은이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명나라 때의 학자인 범립본(范立本)이라는 사람이 1393 년 처음으로 『명심보감』(상하 2권)을 엮었다. 이것을 원본으로 해서 고려시대 충렬왕 때 사람인 추적이 내용을 가리고 추려서 새로 『명심 보감』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이 추적의 초략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전해 내려오는 가운데 다시 5편의 글이 더 증보되었다. 지금의 통행본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과정은 위에서 서술된 사항과 거꾸로이다. 제일 처음에는 엮은이가 누구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로 초략본이 유통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대구(大邱)의 인흥재사본 (仁興齋舍本)이 유포되면서 엮은이가 추적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뒤에 성균관대학교 이우성(李佑成) 교수에 의해 청주판(淸州版) 『신간교정대자명심보감 (新刊校正大字明心寶鑑)이 발견됨으로써 초략본의 원본이 있다는 사실과 원본의 엮은이가 범립본 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명심보감』을 세 층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명나라 때 범립본이 엮은 원본 『명심보감』이다. 둘째, 원본을 토대로 추적의 손에서 새롭게 엮어져 우리나라에 통행된 초략본 『명심보감』이다. 셋째, 추적의 초략본이 통행되다가 누군가에 의해 5편이 덧붙여진 증보편 『명심보감』이다.
범립본의 『명심보감』은 최근에 와서 밝혀진 것으로 추적의 원본으 로서 먼저 있었다는 의미 외에 다른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통행되며 오랫동안 전해 온 추적의 초략본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초략본의 내용을 숙지한 누군가에 의해 내용이 더 보강되어 이루어진 증보편이 더 중요하다. 초략본은 중국의 것 뿐이지만 증보편에는 우리나라의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 이다. 책이 삶과 동떨어져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증보편에서 우리는 책이 삶에 영향을 주고 삶이 다시 책을 더 살찌운 훌륭한 증거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명심보감」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새롭게 덧붙여져 그 생명을 더해갈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추적은 어떤 사람인가?
추적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高麗史) 106권 「열전」(列傳) 19 권에 실려있다.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추적은 충렬왕 때 사람인데 성격이 활달하고 거침새가 없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안동(安東) 서기(書記)로 임명되었다가 직사관 (直史館)으로 선발되었으며 그후 여러 관직들을 거쳐 좌사간(左司諫)이 되었다. 환관 황석(石)이 연줄로 세력을 얻게 되 었는데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그의 고향인 합덕부곡(合德部曲) 을 현(縣)으로 승격시켰다. 이 때문에 추적은 그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황석량은 궁중의 낮은 벼슬아치인 석천보(石天補), 김광연(金光衍)과 함께 기회를 틈타 왕에게 추적을 참소 하였다. 왕이 화를 내며 즉시 그를 칼 씌워 순마소에 가두라고 명령하였다. 그를 호송하는 자가 추적에게 '지름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추적이 거절하며 '무릇 죄가 있는 자는 모두 해당 관청으로 가는 법이다. 왕의 처소에서 칼과 철쇄를 씌우는 법은 없다. 나는 마땅히 네거리로 지나가서 나라 사람들에게 이 모양을 보여야 한다. 간관(諫官)으로서 칼을 쓰고 가는 것을 영광이라 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나 여자들처럼 얼굴을 가리우고 선비로서의 체면을 버리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는 관직이 민부 상서, 예문관제학에 이르러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는 늙어서도 밥을 잘 먹었는데 항상 '손님 대접은 쌀밥이나 무르게 짓고 생선을 썰어서 국이라도 끓이면 충분하지 무엇하러 많은 돈을 써가며 팔진(八珍: 여덟 가지 진미)을 구해 올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위의 기록을 참고로 추적이란 인물을 그려본다면 우선 공인(公人)으로서 추적은 공명정대한 인물이었던 것같다. 좌사간이란 벼슬은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며 고치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로서 공명정대함을 공증받은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였다. 황석량의 무고한 참소로 감옥에 갇혔을 때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추적에게서 진정한 선비상을 엿볼 수 있다.
한 가정 안에서의 추적은 검소하고 청렴한 인물이었던 것 같다. 손님 대접은 쌀밥에 생선이면 충분하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그런 추적의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다. 예문관제학이라는 고위직까지 올랐 던 사람으로서 쉽게 지닐 수 없는 소박하고 검소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6. 이 시대에 주는 의미
『명심보감』은 400여 년을 지탱해 온 책이다. 그것은 시대를 뛰어 넘는 무언가 보편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서당교육이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천자문』과 『사자소학을 뗀 아이들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들을 가르쳐 주던 교재였다. 그 이후 교육제도가 바뀌어도 『명심보감』은 여전히 삶의 지침서로서 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부터 더 나아가 친구와 친구, 스승과 제자, 윗사람과아랫사람 등의 수많은 관계를 맺게 된다. 『명심보감』은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말하고 있다.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형으로서, 아우로서, 아내 로서, 친구로서, 제자로서, 한 가정안에서든 사회 안 에서든 윗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책임있게 꾸려가야 할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형식으로 생각하게 해준다.
물론 『명심보감』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지금과 동일하지는 않다. 임금과 신하로서의 관계를 지금 다시 논한다면 시대착오적일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믿어졌던 하늘 또는 천명 개념도 지금 과 맞지 않다. 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은 세세하면서도 남성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말은 찾기 힘든 점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우리는 『명심보감 속에서 삶의 요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보편 적인 가치와 함께 그시대에만 한정되는 한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마음에 소롯이 와닿는 구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지금과 맞지 않는 말이야 하고 소리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읽는 이에게 달린 고유한 몫이리라.
[출처] 추적(秋適)역음/백선혜 옮김
[명심보감]홍익출판 page 11-21
